카페라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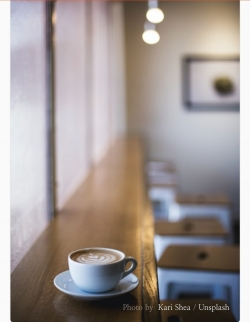
공간 읽기
마혜경
카페에 자주 가는 편이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카페에서 멍때리기도 하지만 자투리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보내는 경우가 더 많다. 카페에 발을 들였다면 제일 먼저 사람들의 수다가 섞여서 귀에 소음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어폰을 꽂아야 한다. 잡다한 소음에는 음악이라는 지우개가 제격이다.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몰입한다. 소설 읽기에 적당한 조도와 멀리 보이는 초록 나무가 페이지를 하나둘 넘겨준다. '혼자'를 즐기기에 좋은 공간, 푹신한 의자와 한몸이 되었다면 일어서기 힘들다. 그러나 이런 평안함도 한 시간이 지나면 팔다리부터 쥐가 나서 깨진다.
주위를 돌아본다. 옆 테이블에 시선이 닿는다. 이어폰을 잠시 빼기로 했다. 여자들은 뭐가 즐거운지 돌림노래 하듯이 웃는다. 셔츠 배 부위에 빵부스러기를 묻힌 채 하하 웃으며 손으로 테이블을 때린다. 한 여자는 내가 다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버릇이 된 것 같다. 눈에는 초점이 없고 목소리는 높낮이가 불분명하다. 주위 여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 여자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동의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주 창밖을 바라본다.
내가 다해봐서 아는데,라고 말한 여자가 화장실에 간 동안 나머지 여자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말을 꺼낸다. 결론은 아니꼽다는 건데 당당하지 못하게 화장실 쪽은 왜 살피는지 알 수 없다. 그 짧은 시간에 세 명의 여자가 각자 할말을 했다. 그건 아니고,라는 말과 나는 더 해봤다,라는 말이 겹쳐 냉소적인 분위기가 돌았다. 그러나 곧이어 온다 온다,라는 말 한 마디에 모두 자세를 고쳐앉고 그래서 그랬구나,라며 어정쩡한 말로 시치미를 떼는데 옆에서 보기에 큭큭 웃음이 절로 나왔다. 여자들이란... 아니 인간들이란...
카페에 갈 때마다 이런 모습을 자주 만난다. 그래서 이어폰을 빼고 엿들을 때가 많다. 동그랗게 모여 앉았다면 마음도 하나로 동그랗게 오므려질 줄 알았는데 빈 자리가 생기면 부정적인 수다가 창조된다. 평소 마음에 두었던 생각이나 순간 올라오는 느낌을 가감없이 꺼낸다. 카페라는 공간은 마음의 빗장이 잘 풀리는 곳이다. 대화가 많은 곳이라 말의 실수가 잦은 곳. 씁쓸한 커피를 마시며 사색하는 공간이 되면 좋으련만.
'살롱'은 프랑스어로 '방'을 의미한다. 19세기까지 예술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들이 살롱에 모여 사교와 함께 서로의 취향을 응원했다. 나이를 불문하고 상대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공간인데, 다행히도 과거의 시간과 공간이 청년들 사이에서 부활하고 있다. 합정동을 중심으로 '아트살롱'이 만들어졌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사색의 주제를 담은 대화가 오고간다.
인간들이란... 결핍의 동물이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래서 거울을 보듯 타인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는 곧 내 앞에 있는 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독특한 취향과 의식을 공유하며 함께하기 위해 누군가 잠시 비운 자리는 침묵으로 깨끗이 보존해야 한다. 그러기에 카페라는 공간은 아늑하고 사려 깊다. 아무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