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월간지 『에세이스트 』 111호 2023년9-10월호
블로그를 지우며 / 김주선
단풍나무 이파리가 파닥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비가 제법 내리는 주말, 꿀맛 같은 낮잠이었다.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개인 웹 사이트를 정리하고자 컴퓨터를 켰다. ‘나도 너처럼 장미였노라’ 블로그 대문을 장식하는 헤드라인 문구에 먼지가 낀 듯 침침하게 보였다. 돋보기를 꺼냈다. ‘나도 장미였던 시절이 있었노라. 누군가의 가슴에 선홍빛으로 핀 장미였던 시절이.’ 블로그에 적힌 한 줄 소개 글이 무색하리만치 온기를 잃은 방은 적막이 가득했다.
나는 블로거였다. 초창기에는 주로 라이프, 요리, 여행을 다루었다. 라이프는 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영역이었다. 일상뿐 아니라 절기별 행사와 집 꾸미기 같은 살림 정보도 게재해 놓았다. 차탁이 놓인 방에 커피 한 잔을 그림으로 그려 놓고 등록된 친구만 방문하도록 했다. 소통하던 이웃집 블로거가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갔다. 통계관리를 보니 지난 6월에 집중적으로 다녀간 이였고 닉네임은 ‘심란해 죽겠어’였다. 내 블로그 살림의 여왕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장아찌 담그는 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금과 설탕과 식초의 비율이 계량과 맞지 않아 오이 한 접이 다 물러졌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심란해 죽겠다니 실소가 터졌다. 아마도 블로그가 오랫동안 방치된 것에 대한 염려와 안부였을 것이다.
블로그 속 나의 사진은 포토샵 앱에서 성형한 예쁜 얼굴이었다. 모델하우스 같은 거실과 주방을 가진, 장밋빛 인생을 사는 사십 대 초반의 여자였다. 삼성동에 있는 모회사의 부장으로 워킹맘 캐릭터로 그려졌지만, 육아를 겸한 직장인의 고충보다 거의 자랑질이었다. 요리도 잘해 단골이 많았고 특히 살아가는 이야기인 ‘고민을 나누어요’의 카테고리는 고부간의 문제나 부부 문제, 더러 경조사의 부조금 액수 같은 사소한 고민도 올렸다.
블로그의 S’다이어리에 올려놓은 나의 글은 검증이 안 되었으니 창작이라 보기도 어려웠다. 대게는 일상다반사 잡기였다. 대부분 포장되고 잘 꾸며진 삶이었다. 등뼈가 하나인 샴쌍둥이처럼 또 다른 자아가 살았다. 쓸데없는 기록 따위에 발목을 잡혀, 열등감과 상처를 숨긴 채 환경에 적응하고 욕구를 충족시켰던 모양이다.
그러나 현실 속의 나는 소심하고 낯가림이 심한 여자였다. 주근깨가 많아 예쁘지도 않았다. 차변 대변의 오차범위 1도 허용이 안 되는 세무회계업무, 빡빡하게 일하고 급여는 낮은 직업을 가졌다. 게다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사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 아이도 셋이었다. 집안은 늘 어질러져 있었다. 친정과 시집 식구들이 번갈아 살림을 퍼 날랐으니 요리는 입으로만 했다. 무엇이든 잘하는 게 없는 그런 여자였다.
집채만 한 느티나무 그늘에 가려진 고향 집 안방은 보잘것없었다. 남들처럼 자식 자랑으로 도배할 상장이나 자식의 졸업 사진 한 장 없는 단출한 방이었다. 달랑 벽시계 하나만 걸린 방이었어도 전혀 기가 눌리지 않는 꼿꼿한 엄마가 계셨다. 어쩌다 주렁주렁 열린 붉은 꽈리를 묶어 벽에 걸어 두면 그것이 그림 액자였고 이야기가 있는 방이었다. 댓돌 위에 놓인 고무신 한 쌍이 서울에서 온 뾰족구두보다 아우라가 있었던 집, 그런 삶이라면 모를까. 나의 블로그는 허영이 가득했다.
나는 중요한 그 무엇이 상실되는지도 모른 채, 메커니즘에 길들어서 살았던 게다. 등단하면 정리하고자 했던 일이었다. 나의 수필에 아이디도 필명도 아닌 실명을 선택했던 것은 화장을 지운 민낯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런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간 내 글을 읽어 본 어느 작가님이 SNS를 하는지 물어왔다. 내 마음속을 더 들여다보고 싶다며 블로그 빗장을 풀어달란다. 순간, 교만한 장미 가시에 심장이 찔린 듯 따끔거렸다. 여성 잡지의 표지처럼 꾸민다고 삶이 화려한 것은 아닐진대 새삼 양 볼이 화끈거렸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장미 넝쿨로 담장으로 두르고 싶었던 열망을 손질했다. 호미로 밭을 갈아엎듯 내 삶의 전체든 아니면 일부든 갈아엎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거짓 세상에 궁궐을 짓고 허황한 삶의 가치를 탐닉한 장미의 시절이여, 이젠 안녕. 연락처에서 옛 연인의 전화번호를 지우듯 단호하게,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쓱쓱 지워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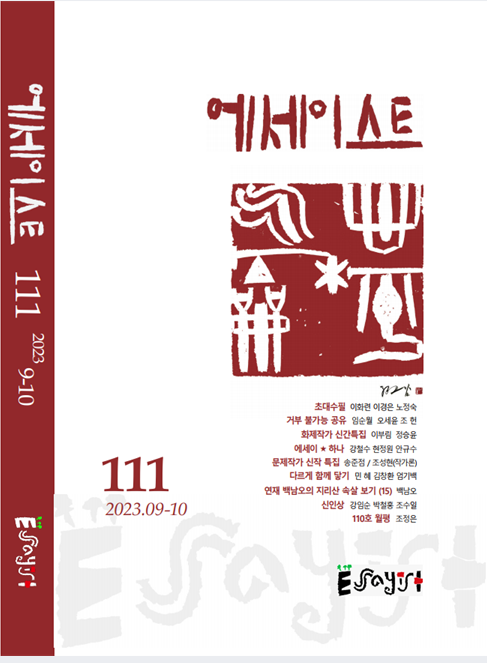
김주선
강원도 영월 출생.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으며, 2020년 『한국산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인터넷신문 미디어피아 전문기자로 <북&컬쳐>에 수필을 쓰면서 활동하였고, 2021년 제15회 바다문학상과 2022년 세명일보 신춘문예 시(詩)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2년과 2023년에 『The 수필 빛나는 수필가 60』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2023년 『에세이스트 대표수필 50』에도 선정되었다. 대학 수필동아리 ‘수수밭’의 동인지 제5호 『폴라리스를 찾아서』, 제6호 『목요일 오후』 제7호 『산문로 7번가』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