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고니? 가상이 아닌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터전
‘마하고니’라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번영과 몰락을 겪는 자본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자 풍자극인 쿠르트 바일의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이 한국에서 초연되었다. 지미를 비롯한 네 명의 남자들은 알라스카에서 7년간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벌목꾼으로서 돈을 벌어 이제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마하고니에 와서 인생을 즐기려는 어찌보면 피카레스크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브레히트와 바일은 오페라라는 장르에 대해 음악적으로, 연극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많은 비판을 하였다. 그들은 대중목욕탕을 방불케하는 다중시설인 오페라하우스와 거기서 공연되는 작품들이 자본의 상징이요, 대중을 마비시키는 미식가적인 오락물(텔레비젼의 발명 전이니 웃고 즐기고 드라마를 시청하는 도구였을)로 청산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래서 아마 <마하고니> 역시 몇 명의 성악가과 무용가 그리고 소규모 밴드로 연주되는 카바레나 작은 극장에서 연주하는 노래극(Songspeil)이 원작이었을 건데 반해 오늘은 엄청난 크기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태동기 시대의 복색을 착용한 인물들을 만나는 역설을 겪었다. 브레히트의 대본 자체가 재미를 포함 권선징악까지 내포하고 있으며 구성도 탄탄하고 블랙 유머가 많으며 계몽적이고 선동적이다. 그리고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편이다. 무용이야 빈약한 무대와 시각적인 효과를 대신 충족시키려는 목적이지만 과도했다. 강원도 정선이나 대학로에서의 서사극으로서의 <마하고니>였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그렇게 많은 장면에 출연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공연이다 보니 뭔가 대체제가 필요한 고육지책이다. 다만 이번의 초연은 내용적인 면보다 쿠르트 바일의 음악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등장인물의 감정을 극대화 하여 노래의 떨림에서 오는 음악적 감동인 아리아가 아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논평하거나 몇번 듣거나 악보를 보면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유절형식의 노래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극과 장면, 연극으로서의 갈등과 긴장구도 형성을 위한 드라마적인 음악기능보다 장면에 맞는 노래로 되어 있는 번호오페라(Nummeroper)로서 뮤지컬의 넘버(Number)와 같다. 쿠르트 바일의 음악기법은 입체적, 그래서 '짬뽕'이다. 융복합이네 퓨전이네 하는 시도는 잘못하면 이도저도 아니다. 바일이 얼마나 독일의 음악과 서양클래식 음악에 정통해 있는 토대에 그 시대 유행한 트렌디한 요소 그리고 민중들의 음악성향까지 제대로 파악하고 부응하면서 시대상을 반영하려고 했는지 무대를 보지 않고 음악만 들어도 즐겁기 그지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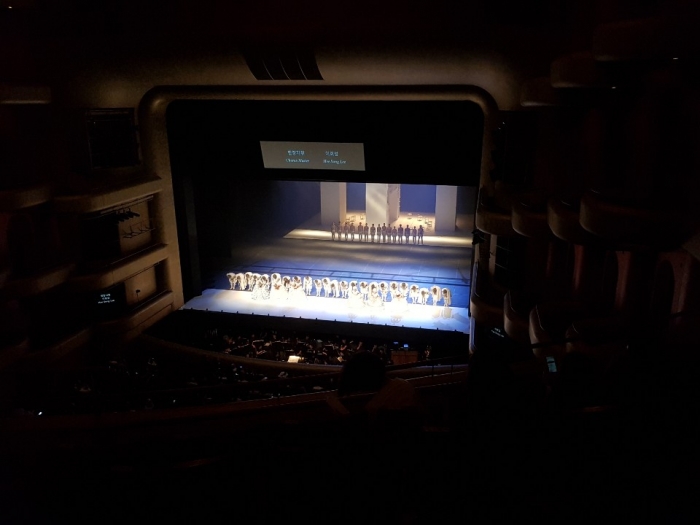
1막 끝부분의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인용이 그 좋은 예이다. 재즈가 가미되어 나오는 선율에 등장인물 중 하나가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예술이야"를 외치니 누구 놀리는 것인가! 물론 그 의도는 충분히 파악된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인기있고 누구나 아는 곡을 일부러 가져와 '예술을 위한 예술'을 비판하고 허영심을 꼬집은 것이다.
2막에서부터 4명의 남자들이 마하고니 도시 내에서 참교육을 당할 때마다 나오는 전개는 영화 <찰리의 초콜렛 공장>에서의 움파룸파 족이 부르는 노래 같았다. 후크송적인 요소도 약간 가미되어 있어 바일 특유의 다양한 음악 장르와 스타일이 여과 없이 펼쳐졌으며 허리케인이 지나간 마하고니에서의 환락, 유흥이 4명의 남자들과 군중들의 환호성으로 대변되었다.
3막은 부분부분 불쾌했다. 브레히트의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선동적이고 주입식이었기 때문이다. 브레히트 시대의 사회상, 당시 만연하던 무정부주의자, 하이퍼 인플레이션, 실업, 돈이면 다 되는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경멸이 확연히 들어났다. 돈보다 가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돈이 없는 지미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열변한다. 마하고니의 일상 규칙은 '폭식, 폭음, 성의 상품화, 복싱으로 대변되는 스포츠의 광기'로 이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3S로 대변되는 우민화 정책에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동조하고 환호한다. 3막은 일부러 어그로를 끌기 위해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데 일부러 말려들지 않으려고 나부터 발악을 하지만 그러지 않다고 당당히 저항하지 못한 나의 비굴함을 통렬하기 대문에 불편하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새롭게 건설된 소돔과 고모라가 마하고니인가? 서울인가? 브레히트가 미래 21세기 서울이라는 도시와 한국의 천민자본주의에 대해 미리 예견하고 서울을 모델로 한 것인가? 이런 도시에 몰려오는 온갖 범법자들이라면 나는 떳떳하고 여기 살기 위해 페르소나를 쓰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물음이 끊이지 않았다. 마하고니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행악은 '빚'이라면 나부터 죽어야 되니 마지막 시위 장면은 괴로웠다.
행복을 위한 댓가로 돈을 지불해야 해서 지갑을 열어보니 100달러는 커녕 10달러도 없었다. 단지 천원짜리 몇장이 다이지만 인간의 행복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어찌보면 브레히트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인지하는 사실에 대해 같이 저항하게 만든다. 결국 <마하고니> 공연의 본 목적이 달성되었다. 그래서 또 뒷맛이 씁쓸하다. 알면서도 해야하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내 모습이 왠지 들킨거 같아서.......

